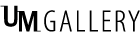허혜영 / HUH Hae Young
허혜영 | 2022.06.21 (화) ~ 2022.07.02 (토)
Artist’s Statement
그림 속에 내가 존재하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그림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을 느낀다. 그림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인지, 내 속에 그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낀다.그림은 그릴 때마다 매번 어렵다. 늘 처음 그리는 것만 같기도 하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릴 때도 있다. 작품을 대할 때는 ‘어떻게 그릴까?’를 계획하면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그저 느낌, 혹은 영감이 한 가지라도 떠오르면 바로 시작하는 편이다. 그래서 늘 내 마음과 대화를 하는 것만 같다.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도, 내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그렇다.
나의 붓이, 나의 나이프가 어디로 향할지 캔버스 내에서의 여행을 기대한다.
매일 작업실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상을 사랑한다.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가의 물음에 도달할 때도 많다. 사실 그림이라는 게 선, 면, 동그라미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가끔은 나의 그림이 다른 여러 작가의 리듬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나 자신이 나를 보고 그리지 않는 한 나의 내면세계를 누구든지 보았는가?
혹은, 내가 다른 누구의 내면을 보았는가? 절대 아니다. 내 그림은 오로지 나 홀로 외로움을 지우고 딛고 밟고 거름 삼아 만든 나만의 고유한, 짙은 나만의 향기이다.
캔버스에 물감을 바르고 긁고, 다시 바르고 하는 이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에 뜻이 있다. 일종의 축적이 아닌가? 마치 유년과 청년, 그리고 중년의 발자국처럼 그간의 경험들을 삶에 새기며 살아왔듯이 나의 작업도 그렇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온 나날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오롯이 한 사람의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기억이 작품으로 솟구치는 것이다.
<untitled vol.2>는 아마도 어쩌면 그렇게 축적해온 나날들을 늙어가며 죽음으로 도달해가는 기로에서 꽁꽁 매여 있던 희로애락을 풀어버리고 싶었기에 그렸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쌓아 갔던 <untitled vol.1> 또한 그리는 동안 즐거웠고 큰 기쁨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반면에 이번 vol.2는 구체적으로 다른 추상의 길을 찾기 위해 붓 터치와 정신,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며 작업했다. 그 작업의 첫 부분은 캔버스에 물감을 말 그대로 대책 없이, 자유롭게, 의식의 흐름대로 바르고 그 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이다.
창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해 봐야 알 수 있듯이 그 믿음으로 vol.1을 시작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유화물감의 두께와 묵직함, 긁어내는 반복의 단순함에 이끌렸었다. 반면 vol.2는 풀어가는 재미라고 할까? 마치 vol.1 이 색과 물감의 뭉치라면 거기서 가닥을 끄집어내는 재미가 vol.2에는 있다. 내가 좋아하는 색 들로 이루어진 그 물감 창고 같은 곳에서 꺼내 쓰는 맛.
이미 vol.1에서 느낀 것을 덜어내고 새로운 것을 이 나이에 와서 다시 만나는 의미도 있었다. 내가 그림을 끝내게 되는 날이 있을 때, 그때는 이 과정 또한 축적이라고, 아름다웠던 나 개인에게는 소중했던 ‘그림 길’ 이었다고 하겠지.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한 적 있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의 정신, 그것으로 나의 실존을 느껴 온 작가로서의 희망을 아주 그림을 못 그리게 되기까지 마음은 항상 그림 밭에서 그림 길을 찾거나 그리고 있을 듯하다.
강원도 영월군 쌍용리
나는 유년기를 강원도 쌍용리 라는 곳에서 보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쌍용시멘트가 있었고 아마 6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일 것이다.
학교를 오가는 길은 산이 많은 지역이라, 낮은 구릉들과 꼬불꼬불한 길도 있었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신작로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학교를 오가는 길들이 좋았다. 매일 다니는 동안 환희스러운 벅찬 감동으로 꽉 찰 때도 많았다. 산골의 특색인 계절마다 다른 들꽃들과 갖가지 모습들의 나무들, 산딸기와 온갖 풀들은 길 가던 나를 앉게 하고 한참을 들여다보게 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자연을 그리워했다. 지금도 매일 자연을 그리워하며 어릴 적 창밖으로 보던 구름까지도 아직 무지하게 그리워하며 산다.
그렇게 나는 나의 어린 모습을 그림 속 꽃들 사이에 그렸다. 나도 모르게 그렸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인간의 형상을 그리지는 않았었지만 나의 유년기를 그리며 생의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하게 된 것이 좋았다.
인간의 시작부터 유아기, 청년기를 거쳐 노년기를 맞아 죽는 것이 완전한 삶인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항상 미완성이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불규칙한 인생이 사건의 연속이 아닌 살아온 그림이라고 생각하니 꼭 소용에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림이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저 아름다우면 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타인도 좋은 것이다. 내가 관객에게 선보이는 하나의 공연인 것이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캔버스를 꽉 채울 필요도 없다. 기쁘면 기쁜 대로,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대로 표현한다. 음악을 들으며 작업하면 그 감정을 그려나간다.
그렇게 새 그림을 시작할 때 늘 캔버스 자체를 생각하려고 한다. 캔버스 밖, 또는 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단지 점 하나를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내키는 대로 마음껏 놀 수도 있다. 캔버스 밖에서 작업하고 싶을 때도 있다. 자유롭게.
결국 인간의 삶은 늘 갈등, 결핍, 그리고 상처들이 동반된다. 현실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부족과 살아가면서 생긴 갈등 또는 상처를 스스로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에너지가 있다. 나는 그 에너지가 꿈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꿈은,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는 그림이다.
그림을 그릴 때 나는 행복하다.
그림은 나의 정체성을, 살아있음을, 나아가 존재의 이유까지 되어준다.
그렇기에 그림이 현재 나의 전부가 되었다.
오늘도 즐거운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