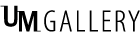박계훈 PARK Gyehoon < Outside the Garden >
박계훈 | 2024.09.12 (목) ~ 2024.10.31 (목)






무수히 많은 콩나물, 또는 원통형의 형상이 화면을 빼곡히 채운다. 머리의 방향만 다른 채 거의 유사한 사이즈로 반복되고 있는 일종의 기호들은 색을 꿰맨 듯 꼬이거나 겹쳐져, 금색의 옻칠 혹은 오묘한 색으로 뒤엉킨 화면을 점령한다. 화면을 뒤덮은 이들은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마치 커다란 소리나 연주할 수 없는 음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거의 빈틈없이 중첩해 낸 이미지를 통해 역사적 외상(trauma)을 현재화하는 박계훈 작가는 UM갤러리에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인전 《정원 밖 Outside the Garde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은 왜 파국 이후에 출현하는가”를 탐색하며 궁극적으로 예술의 동시대적 개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변주 중 하나로서 기획되었다.
콩나물의 매체적, 주제적 변주
그간 박계훈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자신의 코멘트를 연하디 연한 콩나물을 매개로 표현해왔다. 그리고 그 콩나물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담보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3차원의 공간에 싹을 틔웠다. 가령 1999년부터 2002년, 3년간 매일 삼베 천을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1천 여개의 콩나물을 만든 설치 작업 <Melancholy>는 현대 자본주의 논리, 다시 말해 빠른 시간이 곧 부, 성공, 현대인이라는 명제를 반박하고, 나무젓가락, 튜브를 활용해 작업한 <Lovers under the moon>(2003)과 같은 작업은 ‘복제’를 제시하며 유전 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이후 종이 오리기로 옮겨진 그의 관심은 사물의 본질에 접근해보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번 전시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작가가 그간 선보였던 콩나물의 형상과 그 반복은 유지하되 3차원에서 2차원의 평면으로, 매체를 변화시키고 주제를 확장함으로써 다시한번 그간의 작업을 과감하게 변주해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매체를 탐구하고 기존의 작업 주제에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박계훈은 곳곳에 보이는 각목이나 브라켓 등을 활용하여 설치적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회화를 선택했다. 끝이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종이의 거친 끝 면 마저 작가가 변주한 고민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박계훈 작가 작업에 있어 커다란 변곡점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다.
‘정원 밖’의 사건을 인지하는 방식 – 외상의 반복
《정원 밖 Outside the Garden》은 서사를 풀어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롭다. 작가는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역사적 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Zone of Interest)’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전한다. 작가는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공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의 낮은 단계로 떨어뜨리며 그 의미를 축소해 나가는 영화의 진행 방식에 주목했다. 가령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프레임에 꽃들이 가득한 한없이 예쁜 정원이 들어온다면 담벼락 ‘밖’으로는 총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고함과 비명, 철조망, 연기 등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모티프들이 병치되는 식이다. 직접적으로 공포를 목격한다기보다 평화로운 일상에서 쿡쿡 찌르듯이 등장하는 공포의 모티프들이 암시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메시지는 가히 심화된다.
우리의 삶도 이 영화와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는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시켰던 콩나물 머리와 같은 형상들을 꽃들로 변주시켜 ‘정원’을 조성한다. 다양한 색들이 중첩된 ‘꽃’으로 가득 찬 정원은 일견 평화로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깨지기 쉬운 물성을 지닌 꽃들은 얼룩져 있고 화면에는 많은 스크래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꽃이라는 연약한 존재에 가해진 날카로운 스크래치는 꽃의 ‘외상’을 표상한다. 그리고 화면을 온통 뒤덮은 외상은 강박적으로 보이다시피 반복되고 있다. 꾸준한 과거의 설치 작업에서 볼 수 있었듯이 무수한 콩나물은 반복되고 증식해왔다.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면 이는 열 번 말해질 때 그 의미가 커지게 되는 것처럼 반복은 몰입과 과장을 수반한다. 따라서 박계훈에게 반복은 단순히 미학적 선택이 아니다. 작가가 화면에 남긴 무수한 행위의 반복이 더해질수록 행적들은 축적되어 강조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처의 흔적은 점차 선명해지며 두드러지는 과정인 것이다.
언젠가 박계훈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다. “꼬리를 무는 생각이 콩나물을 끊임없이 ‘증식’시키고 있다. 시간을 갈아 뭉개고 시간을 씹고 시간을 오리고 시간을 깎고 시간을 바느질한다. 나의 행위들은 시간과 재료를 연결하여 사물의 진실(본질)에 접근해 보려는 과정으로 ‘시간’이 중요한 ‘재료’이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서 반복과 그로 인해 축적된 시간들은 성찰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나아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내밀한 시간들은 곧 작품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서사 방식이 그랬던 것처럼 작가가 지시하는 영역 역시 캔버스 ‘외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은 ‘정원 밖’의 시공간을 가리키는 매개체가 된다. 예쁜 꽃들에 생긴 외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예쁘다’고 치부하는 미감으로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 현실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 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과거의 시간과 현재가 뒤섞이게 된다.
매체적 변화와 서사적 주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조망하는 박계훈의 이번 전시는 작품을 마주하는 현재와 과거, 지금과 그곳의 시간과 공간을 비틀며 감춤과 드러냄 사이의 흥미로운 긴장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재의 답을 제시하게 할 것이다.